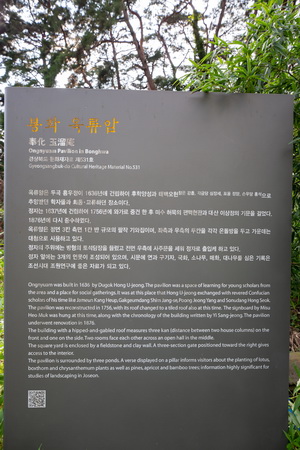- 공간명 봉화 남양홍씨 개절공 두곡종가(奉化 南陽洪氏 介節公 杜谷宗家)
- 주소 경북 봉화군 봉성면 산수유길 202-80
봉화 남양홍씨 개절공 두곡종가(奉化 南陽洪氏 介節公 杜谷宗家)
홍우정(洪宇定, 1595~1656)은 자가 정이(靜而), 호가 두곡(杜谷)이다. 1614년(광해군 6) 진사가 되었다. 1616년(광해군 8) 장인 해주목사 최기(崔沂)가 해주옥사의 역적 괴수로 몰려 처형되자 이에 연루되어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원두표(元斗杓)와 이해(李澥)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져 8년 동안 천안에 부처되었다가 1623년(인조 1)에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1629년(인조 7)에 학문으로 천거되어 대군사부가 되었고, 1631년(인조 9)에는 내자시직장이 되었다. 1636년(인조 14)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하자 문수산 아래 두곡천가에 작은 집을 짓고 ‘옥류(玉溜)’라 편액하고 스스로를 두곡기인(杜谷畸人)이라 칭하였다. 또 홍우정은 당시 대명의리를 내세우면서 태백산으로 숨어든 심장세(沈長世), 강흡(姜恰), 정양(鄭瀁), 홍석(洪錫) 등과 함께 태백오현(太白五賢)으로 불렸다. 이때의 심경을 읊은 시가 있으니, “명나라 세상에는 찾아드는 사람 없고, 태백산 속에는 머리 기른 중이 있네[大明天下無家客 太白山中有髮僧]”이다. 그 후에도 공조좌랑 등을 제수받았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 지키기 의식과 청나라에 대한 반대의 태도가 산간을 찾아 들어간 그 처사적 삶의 모습 속에 담겨 있음을 표현한 시구라고 하겠다.훗날 절의가 조정에 알려져 1648년(인조 26) 공조좌랑, 태인현감 등이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655년(효종 6) 사재주부에 제수되었으며, 1656년 황간현감에 제수되었으나 명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 묘는 안동 우무곡에 있고, 문산서원에 배향되었다. 승정처사로 영조 때 이조참의, 순조 때 이조참판 등이 증직으로 주어졌다. 1760년(영조 36)에 개절(介節)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으며, 가묘에 치제하라는 명이 있었다. 가문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홍우정에게는 병자년마다 3번 치제하라는 명이 있었다고 한다. 처음 병자년에는 예조좌랑이 내려와 치제하였고, 두 번째 병자년에는 안동부사가 와서 치제하였으며, 세 번째 병자년에는 순흥부사가 와서 치제하였다고 한다. 배위는 증 정부인 해주최씨(海州崔氏)이다. 홍우정의 묘갈명은 문정공 허목(許穆)이 지었고, 충간공 이동표(李東標)가 글씨를 썼다. 행장(行狀)은 참의 이상정(李象靖)이 지었고, 시장(諡狀)은 판서 한치응(韓致應)이 지었으며, 문집의 서문은 대제학 권유(權愈), 묘지명은 판서 이현일(李玄逸), 유허비의 음기는 세마 이광정(李光庭)이 각각 지었다.옥류암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규모이다. 두리기둥을 썼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부연을 빈틈없이 달았다. 여기 부연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양쪽으로 이어놓고 있어서, 목구조의 아래쪽에서 또 하나의 횡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마루는 앞 선의 기둥 앞으로 두어 뼘 정도 나가 있고, 간략화한 형식의 난간을 올려세웠다. 난간은 아래쪽에 한쪽의 판재를 세우고, 각재가 수선 방향으로 올라와 역시 모서리를 둥글린 각재를 횡으로 대어 마감하였다. 중앙에 마루를 두고 좌·우로 방을 배치한 구조이다. 오른편의 방은 정면 1칸 측면 1칸 반 규모이다. 앞 선의 기둥은 이 부분에서 방의 앞쪽 벽으로 편입된다. 왼편의 방은 앞에 반 칸 규모의 마루를 두고 뒤로 물러서 있다.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이다. 정자로 오르는 길은 여기 앞 마루의 왼쪽 측면으로 2층의 섬돌을 두어 마련하였다. 정자 영역으로 들어가는 작은 대문 영역이 앞 마루의 남동 방향으로 조금 비켜 서 있다.
참고문헌
- 이광정 찬, 「두곡비음지(杜谷碑陰識)」, 『눌은선생문집』
-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의 편액2』, 한국국학진흥원, 2016
- 유교넷(http://www.ugyo.net/)

봉화 남양홍씨 개절공 두곡종가(奉化 南陽洪氏 介節公 杜谷宗家)

봉화 남양홍씨 개절공 두곡종가(奉化 南陽洪氏 介節公 杜谷宗家) 옥류암 측면 전경